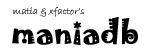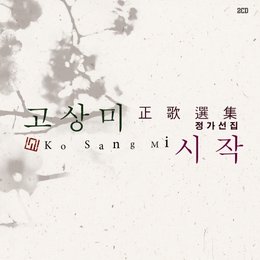| Disc 1 | ||||||
|---|---|---|---|---|---|---|
 |
1. |
| 8:49 | 
|
||
|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구십(九十) 삼춘(三春)에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綠陰芳草)를 승화시(勝花時)라 하든고 북 ;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베를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 모양으로 생겼다 九十; 90일 三春; 봄 석달, 음력 1,2,3월 |
||||||
| 2. |
| 8:33 | 
|
|||
|
言約(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庭梅花)도 다지거다
아침에 우든 까치 유신(有信)타 하랴마는 그러나 경중아미(鏡中蛾眉)를 다스려 볼까 하노라 庭梅花; 정원에 핀 매화 有信; 믿을 수 있다. 즉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나 손님이 온다고 믿는 것 |
||||||
| 3. |
| 6:11 | 
|
|||
|
북두칠성(北斗七星)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憫忙)한 발괄 소지(所志) 한 장 아뢰나이다 그리던 임을 만나 정(情) 옛 말삼 채 못허여 날이 쉬 새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三台星) 차사(差使) 놓아 샛별 없이 하소서 憫忙; 답답하고 딱하여 걱정스러움 발괄 所志; 진정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함 三台星; 저녁부터 날이 새는 새벽까지 보이는 세 개의 별 差使; 심부름꾼 샛별; 새벽 해뜨기 전에 보이는 별, 金星 |
||||||
| 4. |
| 6:20 | 
|
|||
|
바람은 지동(地動)치 듯 불고 구진비는 붓드시 온다
눈 정(情)에 거룬님을 오늘밤 서로 만나자 허고 판첩처서 맹서 받았더니 이 풍우중(風雨中)에 제 어이 오리 진실로 오기곧 오량이면 연분(緣分)인가 하노라 눈 情에 거룬님; 눈짓으로 맺은 임 판첩처서; 장담하여라는 뜻으로 원래는 ‘판척처서’인데 노랫말이 되면서 ‘판첩처서’로 변화됨 |
||||||
| 5. |
| 3:22 | 
|
|||
|
모란은 화중왕(花中王)이요 향일화(向日花)는 충신(忠臣)이로다
연화(蓮花)는 군자(君子)요 행화(杏花)는 소인(小人)이라 국화는 은일사(隱逸士)요 매화는 한사(寒士)로다 박꽃은 노인이요 석죽화(石竹花)는 소년이라 규화(葵花) 무당(巫堂)이요 해당화는 창녀(倡女)로다 이중에 이화(梨花) 시객(詩客)이요 홍도(紅桃) 벽도(碧桃) 삼색도(三色桃)는 풍류랑(風流郞)인가 하노라 向日花; 해바라기 蓮花; 연꽃 杏花; 살구나무 꽃 隱逸士; 은거하는 선비 寒士; 가난한 선비 石竹花; 패랭이 꽃 葵花; 접시꽃 紅桃 碧桃; 붉고 푸른 복숭아꽃 |
||||||
| 6. |
| 3:47 | 
|
|||
| 7. |
| 7:16 | 
|
|||
|
(이랴도) 태평성대(太平聖代) 저랴도 성대로다
요지일월(堯之日月)이요 순지건곤(舜之乾坤)이로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太平聖代; 평화로운 세상 堯之日月; 고대 중국의 요임금 때의 태평한 세상 舜之乾坤; 고대 중국의 순임금 때의 태평한 세상 |
||||||
| Disc 2 | ||||||
| 1. |
| 3:54 | 
|
|||
|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一到) 창해(蒼海)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 할 때 쉬어간들 (어떠리) 靑山裏 碧溪水; 깊은 산속의 푸른 물 一到蒼海; 한번 푸른 바다로 흘러가면 |
||||||
| 2. |
| 4:01 | 
|
|||
|
청조(靑鳥)야 오도고야 반갑다 님의 소식
약수(弱水) 삼천리(三千里)를 네 어이 건너온다 우린님 만단정회(萬端情懷)를 네다 알까 하노라 靑鳥;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전설 속의 새 弱水;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
||||||
| 3. |
| 4:04 | 
|
|||
|
바람도 쉬어를 넘고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개
산지니(山陣) 수지니(水陣) 해동청(海東靑) 보라매라도 다 쉬여 넘는 고개 그 넘어 님이 왔다 허면 나는 한 번도 아니 쉬여 넘으리라 山陣; 산속에서 자라 오랜 해를 묵은 매 水陣; 길들인 매 海東靑; 송골매 보라매; 생후 한 달 미만의 새끼를 잡아 길들인 매 |
||||||
| 4. |
| 4:16 | 
|
|||
|
일년삼백 육십일은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절(四時節)이라
꽃피고 버들잎 푸르면 화조월석(花朝月夕) 춘절(春節)이요 사월남풍(四月南風) 대맥황(大麥黃)은 녹음방초(綠陰芳草) 하절(夏節)이라 금풍(金風)이 소슬하여 동방에 버레 울면 황국단풍(黃菊丹楓) 추절(秋節)이요 백설(白雪)이 분분(紛紛)하여 만경(萬頃)에 인종멸(人踪滅)하면 창송녹죽(蒼松綠竹) 동절(冬節)이라 인생칠십 고래희(古來稀)라 사시가경(四時佳景)과 무정세월(無情歲月)이 유수(流水)같이 흘러가니 그 아니 애달픈가 大麥黃; 보리가 익음 金風; 가을 바람 萬頃; 넓은 들판 人踪滅; 사람의 자취가 끊어짐 古來稀; 예로부터 매우 드묾 |
||||||
| 5. |
| 5:29 | 
|
|||
|
푸른 산중하에 조총대 드러메고 설렁 설렁 나려오는 저 포수야
네 조총대로 날 버러지 길짐생 길 버러지 날짐생 너새 증경이 황새 촉새 장끼 까토리 노루 사슴 토끼 이리 승양이 범 함부로 탕탕 네 조총대로 다 잡을지라도 새벽달 서리치고 지새는 밤에 동녘 동다히로 홀로 짝을 잃고 게 울음 울고 게 울음 울고 울고 가는 외 기러길랑 행여나 네 놓을세라 우리도 아무리 무지허야 사냥 포술망정 아니 놓삼네 너새, 증경; 짐승의 이름 포술; 총 쏘는 기술 |
||||||
| 6. |
| 4:04 | 
|
|||
|
건곤(乾坤)이 불로월장재(不老月長在)하니
적막강산이금백년(寂寞江山今百年)이라 어히요 이히요 이히요 이히야 일심정념(一心情念)은 극락(極樂) 나무아미상(南無阿彌像)이로구나 야루느니나 야루나 乾坤不老月長在; 하늘과 땅이 늙지 않고 달도 도한 오래도록 있으니 寂寞江山今百年; 적막한 강산이 이제 백년이나 지난 것 같구나 極樂南無阿彌像;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게 하는 부처님 생각뿐이로구나 |
||||||
| 7. |
| 8:43 | 
|
|||
|
춘면을 느짖깨어 죽창(竹窓)을 반개(半開)허니
정화(庭花)는 작작(灼灼)헌데 가는 나비를 머무는 듯 안류(岸柳)는 의의(依依)허여 성긴 내를 띄웠세라 창전(窓前)에 덜 괸 술을 이삼배(二三盃) 먹은 후에 호탕(豪蕩)하야 미친 흥(興)을 庭花 灼灼; 뜰의 꽃이 붉다 岸柳 依依; 강 언덕에 있는 버드나무는 싱싱하여 푸르고 |
||||||
| 8. |
| 5:52 | 
|
|||
|
수양산(首陽山)의 고사리를 꺽어 위수빈(渭水濱)의 고기를 낚아
의적(儀狄)의 빚은 술 이태백(李太白) 밝은 달이 등왕각(藤王閣) 높은 집에 장건(張騫)이 승상(乘槎)허고 달구경 가는 말명을 청허자 바람불고 눈비오랴는가 동녁을 바라보니 자미봉자각봉(紫微峯紫閣峯) 청청(淸淸)밝은 달이 벽소백운(碧宵白雲)이 층층방곡(層層坊曲)이 절로 검어 휜들 휘휜들 네로니네로 노느니 나네헤니루허고 나루니루허고 네로 나니나루나루니루 허고 네루레니 느니나노 느흐나니 나느니나노느니나노 노느니라 首陽山歌는 중국의 청렴한 충신이었던 백이 숙제의 故事와 중국 영웅 호걸들의 생애를 들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함, 인생은 허무하니 風流하며 즐기자는 내용 首陽山 渭水濱; 중국의 산과 강 儀狄; 중국 上古시대에 술을 만든 사람 張騫; 중국 前漢시대의 외교가 碧宵白雲; 푸른 하늘, 흰구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