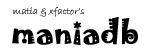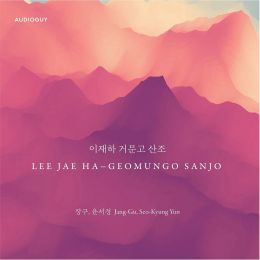이재하 거문고 산조 / LEE JAE HA GEOMUNGO SANJO
크레딧
Geomungo : 이재하 Jae-Ha Lee
Jang-Gu : 윤서경 Seo-Kyung Yun
Recording Engineer : 최정훈 Jung-Hoon Choi
Assistant Engineer : 고승현 Seung-Hyun Koh
Project Manager : 박윤지 Yun-Ji Park
Recorded & Mastered at Audioguy Studio, Seoul
Microphones:
Neumann USM69
Violet Design Flamingo Stereo
Shure Beta 57A
Microphone Preamplifier:
RME Micstasy
Recording Format:
24/44.1
트랙리스트
<긴 산조> <LONG SANJO>
트랙 1. 다스름 Dasrum 1:14
트랙 2. 진양 JinYang 21:16
트랙 3. 중모리 Jungmori 7:26
트랙 4. 중중모리 Jungjungmori 5:01
트랙 5. 늦은 자진모리 Slower Jajinmori 1:31
트랙 6. 자진모리 Jajinmori 7:33
<짧은 산조> <Short SANJO>
트랙 1. 진양 Jinyang 2:40
트랙 2. 중모리 Jungmori 3:12
트랙 3. 중중모리 Jungjungmori 4:17
트랙 4. 늦은 자진모리 Slower Jajinmori 1:28
트랙 5. 자진모리 Jajinmori 4:15
TOTAL 60:02
라이너노트
거문고 산조는 1800년대 말 충남 강경지방의 백낙준(1876~1930)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후 백낙준의 가락은 박석기(1899~1952)와 신쾌동(1910~1978)에게 전승되었다. 한편 박석기의 제자였던 한갑득(1919~1987)은 백낙준의 거문고산조에 자신의 가락을 더하여 또 다른 거문고산조의 유파를 형성하였다. 신쾌동, 한갑득 두 거목의 거문고 산조는 높은 음악적 완성도를 통해 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현재 대부분의 거문고 연주자들은 ‘신쾌동류’, ‘한갑득류’ 두 가지 유파의 산조를 연주하며 음악생활을 하고 있다.
국립국악원에 입사한 후 아쟁 연주자 윤서경(1978~)에게 임동식(1950?~1980?)의 거문고 산조 음원을 받고 이를 본보기 삼아 학습하기 시작했다. 당대의 명인 명창과 함께 예술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냈던 아천 김영철(1942~) 화백의 녹음으로 남게 된 임동식의 음원은 장구 반주없이 거문고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연주 시간이 40여 분에 이르는 긴 산조이다. 임동식은 서른 초반에 요절한 거문고명인으로 판소리명창인 임준옥과 성옥란 사이에서 태어나 원광호에게 사사받은 가락에 자신만의 독공으로 한갑득과 신쾌동의 가락을 적절히 배열하고 거기에 본인의 가락을 첨삭하였다. 진양, 중모리, 엇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임동식의 거문고 산조에서 가락 구성은 3분의 2정도가 한갑득의 선율, 나머지 3분의 1을 신쾌동의 선율로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 내외의 독자적인 선율을 연주하였다. 독자적인 선율이 아닌 신쾌동, 한갑득의 가락을 연주할 때도 전조의 유연성이나 계면조의 성음, 주류와 다른 시김새, 붙임새는 임동식의 거문고가 가진 특별한 매력이다.
‘이재하 거문고 산조’는 임동식의 거문고 가락과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하며 정리한 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성음을 들으며 거문고의 표현과 주법, 시김새로 자신만의 산조를 연주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스승과 다른 명인의 가락을 익혀 한 없이 자유로운 가락들을오랜 시간 연마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독특한 표현과 스스로의 이야기를 포함 시키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하 거문고 산조’는 다양한 민속가락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실전에서 연주하며 체화된 가락들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 산조란 벗어나지 않아야 할 수 많은 법칙과 철저한 관계 속에 한 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한다. 끝까지 완벽하지 못할 걸 알기에 오늘도 부족한 실력과 모자란 성음을 보완하기 위해 연마한다. 마치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가득 채워 넘치기 직전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일처럼. ”
Geomungo(Korean musical instrument with six strings) Sanjo(representative solo instrumental piece of folk music genre) is begun by Baek Nakjun(1876~1930) at Gang-gyeong in Chung-nam province in the late 1800's. Since then the melody of Baek Nak-jun was handed down to Park Seok-gi(1899~1952) and Shin Kwae-dong(1910~1978). Meanwhile, Han Gap-deuk(1919~1987), a disciple of Park Seok-gi, added his own melody to Geomungo-sanjo style of Baek Nak-jun and ended up forming another Geomungo-sanjo school. The Geomungo-sanjo of the two masters, Shin Kwae-dongand Han Gap-deuk, had the high musical maturity and their musical identity was passed down to many disciples. Today, most of Geomungo musicians follow the Sanjostyle of 'Shin Kwae-dong school' and 'Han Gap-deuk school' in playing the musical instrument.
After entering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Lee Jae-habegun to play the Geomungo with referring to a Geomungo-sanjo music source of Im Dong-sik(1950?~1980?) received from Yun Seo-kyung(1978~), a Ajaeng(a seven-stringed instrument) player. The music source of Im Dong-sik recorded by a painter Kim Yeong-cheol(1942~) who interacted with masters and great singers of the time, is a long Sanjo of 40 minute playing time and contains only Geomungo sound without Jang-gu(double-headed drum with a narrow waist in the middle) accompaniment. Im Dong-sik is a Geomungo master who passed away in his early 30's and was born between Lim Jun-ok and Sung Ok-ran, two Pansori masters. He was taught melody by Won Gwang-ho and edited his own creative melody acquired by educating himself into the properly arranged melody of Shin Kwae-dong and Han Gap-deuk. Im Dong-sik's Geomungo-sanjo using various tempos such as Jinyang, Jungmori, Eotmori, Jungjungmori and Jajinmori is made up of Han Gap-deuk's melody of roughly 2/3, Shin Kwae-dong's melody of roughly 1/3 and his own melody of approximately 10% on the whole. Even when he plays the melody of Shin Kwae-dong and Han Gap-deuk, not his own inventive melody, flexibility in prelude, Gyemyeonjo sound, different Sigimsae(ornaments) and Buchimsae(freely improvising beats in plays of melody by players) with mainstream are unique attraction of Im Dong-sik's Geomungo Sanjo.
‘Lee Jae-ha’s Geomungo-sanjo' features Im Dong-sik's Geomungo melody and other melodies acquired through his studying and activities. He was encouraged to perform and create his own Sanjo by making use of Geomungo playing technique and Sigimsae, with studying Im Dong-sik's musical sound. While learning the melodies of his master and other masters, he trained himself for many years to arrange free elements neatly in order and absorb many masters' techniques and ended up creating his own style through using unique expression and melody narrative. ‘Lee Jae-ha’s Geomungo-sanjo', a fruit of his long training, is a new discovery of melody acquired through his discovering various folk music melodies and playing them in the stages.
"Sanjo should be free within the restriction of many rules and relation. I make persistent effort to improve my insufficient ability and fill the lacks of more qualified musical sound in every notes, because I know that a massive effort is needed to reach the stage of perfection. As if pour water into a transparent glass to fill the glass with the water to the very top of the glass persistingly."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