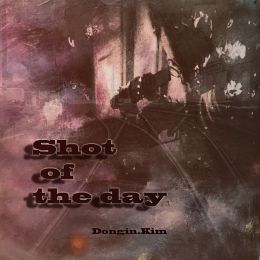같은 말을 쓰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은 집에 살고 다름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워 나를 버린다.
개성 없는 전쟁터 같은 세상은 앞으로 나가기만을 바라고 각자의 손에 들려진 총자루가 어디를 겨누는지조차 모른 채 앞머리를 보며 행렬을 쫓는다.
어디쯤 닿으면 우리는 하나하나의 빛이 되려나
쓸쓸한 고독과 외로움의 무장이다.
누군가 먼저 이 정적을 깨주길 바라는 비겁한 자들이다.
내 모습 또한 다르지 아니함에 기운 빠지는 그런 날이다.
글 / 강채화 그림 / 강채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