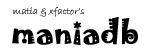슬픈 시는 혼자 쓰이지 않는다.
음악은 언어와 같기도, 언어와 참 다르기도 하다. 말로는 닿지 않는 감정이 있고, 어떤 비-언어적 고요는 침묵보다 선명한 풍경을 남긴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앰비언트를 들려주고 있는 수진의 음악은 언어와 비-언어 사이, 알 듯 모를 듯한 감정의 언저리에 오래 머문다. 누군가를 향해 끝내 건네지 못한 인사처럼 혹은 기어이 전해지고야 마는 미온의 체온처럼. 정규 1집 [잎사귀와 나비의 음향](2022) 이후 3년 만에 내놓는 이번 음반 [슬픈 시 (Our Poetry)]는 이러한 감각을 ‘즉흥성’과 ‘제한’이라는, 상반된 방식으로 다듬었다.
앨범은 ‘무언가를 겪고,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사람’의 음성으로 시작해 끝 역시 그렇게 마친다. 여기서는 가사보다 섬세하고 멜로디보다 미묘한 사운드스케이프가, 한편으로는 구조보다 곡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는 수진이 택한 삶의 태도와 이어진다. 불필요한 편집을 최대한 배제하고, 흘러가는 시간의 감각을 고스란히 담고자 한 노력이 앨범 동명의 타이틀곡 ’슬픈 시’와 마지막 곡 ‘접촉’에 담겼다. 절대 되감을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유기적이고 점진적인 흐름. 이는 음악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 곡은 원테이크로 녹음된 세 개의 즉흥 트랙을 별도의 편집 없이 이어 붙인 구성이다. ‘흐름’이라는 말이 형식이 아닌 연주의 방식 그 자체로 실현된 셈이다. 앰비언트 음악의 기원적 개념 — 즉, ‘무시해도 될 만큼 동시에 흥미로운(must be as ignorable as it is interesting)’ 음악 — 이라는 개념이 전복된다. 수진의 앰비언트는 배경이 아니라 정면이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야 들리는, 여린 울림, 강한 울음으로.
[슬픈 시 (Our Poetry)]는 감정이 번지는 소리로 시작한다. 첫 트랙 ‘어린이대공원’이 먼저 소리의 해상도를 만진다. 좌우 채널이 각기 다른 기억을 고백하듯 들려오고, 반복적인 리듬은 작은 변주의 결을 따라 서서히 균열을 만든다. 타인의 기억이 나의 기억과 중첩되는 과정 같기도 하다. 아직 불투명하기만 한 정서적 물기를 머금은 채 트랙은 어느덧 사적인 고백으로 흘러간다. ‘편지’에서 배시은 시인이 직접 읽는 글귀는, 앞서 수진이 일일이 고백하지도 않은 음반 전체의 정서를 요약한다. “은둔자를 사랑하는 건 은둔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다가서는 일, 말을 거는 행위 자체가 이미 상대의 세계에 침입하는 일이라는 것을 수진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앨범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말한다. ‘사랑에 다다르는 일은 행동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것을. 이 시적인 믿음이 앨범 전반을 이끄는 투명한 지향이 된다. ‘미시령’은 연주의 밀도가 높은 곡이다. 손성제의 색소폰과 클라리넷 그리고 그 사이사이 퍼지는 공간의 잔향은 이 곡을 어딘가 밖으로 끌어낸다. 대부분의 트랙이 수진의 방 안에서 녹음된 반면 ‘미시령’은 다른 존재들과 함께 열려 있다. ‘방해하는 타인’과 ‘이해하는 동반자’ 사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공간에 머문다. 서로가 서로의 은둔을 받아들이는 방식 — 마지막 트랙으로 이어지는 접촉의 시학을 그려내려 한다.
‘슬픈 시’의 영어 제목은 ‘Our Poetry’다. 여기서 ‘우리(Our)’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궁금했다. 인터뷰에서 수진은 참 많은 이름, 얼굴을 떠올렸다.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는 ‘나’를 포함한 배타적 그룹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이것이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정서에 관한 음반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힘겹게 삶과 맞부딪혔던 친구의 얼굴이기도 하고, 거리에서 본 낯선 이의 뒷모습이기도 하다. 슬픔은 개인화된 감정이 아니다. 운문(poetry)처럼 일상의 언어가 낯선 문학의 운율로 묶일 때 그것은 정신이 된다. 우리의 형식이고 우리의 감정이 된다.
[슬픈 시 (Our Poetry)]를 듣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를 듣는 행위와 조금 다르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되묻고,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하는지 떠올리는 일이다. 소리의 예술로서 음악은 모든 실패와 지연 그리고 불완전한 접촉이 그만의 기록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하는 정서 역시 누군가의 ‘다다르지 못한 말’의 집합일지도 모르기에, 앨범은 미완의 말들, 닿지 못한 감정들, 말로는 옮기지 못한 사랑을 대신하여 연주한다. 소속되지 않은 자들의 합창이 된다. ECM의 모토가 ‘침묵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the Most Beautiful Sound Next to Silence)였던가. 이 음반은 소리나 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내고 시를 말하기 전의 고요다. 아니, 그것을 말하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의 발화하기 직전의 숨결이다.
- 대중음악평론가 정병욱(Byungwook Chun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