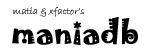‘풍류’는 자연을 벗 삼아 인간의 세속적인 욕심과 사특(邪慝)한 마음을 없애고 인격 함양하여 이른바 ‘道’에 도달함을 말합니다.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풍류의 정신이 깃든 음악을 통한 내면적 깨달음과 자아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명인의 손을 거쳐 전해 내려와 아직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음악, 영산회상과 천년만세.
화려한 기교와 장식 없이 오롯이 가야금에 한음, 한음 얹어진 여백의 미와 담백한 아름다움을 담아봅니다.
- 현림 최미란 -
곡목해설
영산회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풍류 음악이자 기악곡인 이 곡은 모두 아홉 곡으로 구성된 일종의 모음곡이다. 이곡은 조선 후기 이후 줄풍류로 편성된 탓에 [현악 영산회상] 또는 [거문고 회상]으로 불리며 요즘은 [중광지곡]이라는 아명(雅名)으로도 불린다. 그리고 영산회상 자체를 ‘줄풍류’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악곡의 구성은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등 9곡이다. 첫 곡인 상령산은 영산회상의 원형(元型)으로,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上佛菩薩)’이란 노랫말로 부르던 성악곡이었으나, 조선 중기 이후 노랫말이 탈락하고 순수한 기악곡으로 남았다. 이후 변조(變調) 과정을 거쳐 중령산, 세령산, 가락덜이 등의 악곡이 탄생하였고, 삼현도드리와 하현도드리 그리고 염불도드리와 타령, 군악 등의 악곡들이 추가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음곡 체계로 갖추게 되었다.
[영산회상]의 첫 곡인 상령산이 거문고 4괘법에 의한 낮은 음역과 느린 한배로 시작하고, 중령산부터 상현도드리까지는 거문고 7괘법의 높은 음역에 속도로 점차 빨라진다. 그러나 하현도드리에서 음역이 상령산처럼 낮아지고, 빠르기도 느려졌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빨라지는데, 염불도드리 후반에서 긴장감을 더하여 빠르게 몰아가다가, 타령에서 다시 느려지지만 장단을 바꾸어 속도감을 회복한다. 이후 군악에서 빠르기를 더하여 [영산회상] 한 바탕을 마친다.
천년만세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인 이 곡은 세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이다. 첫 번째 곡인 계면가락도드리와 세 번째 곡인 우조가락도드리는 각각 계면조와 평조로 되어 있어 악조의 대비를 이루나, 둘 다 타령 장단을 얹어 연주한다. 이 두 곡 사이에 ‘두 청(거문고의 문현-주요음)을 친다’는 뜻인 ‘양청도드리’를 삽입하여 연주하는 것이 천년만세이다. 천년만세는 그 연원이 불분명한 ‘계면가락도드리’를 제외한 ‘양청도드리’와 ‘우조가락도드리’는 모두 [보허자(步虛子)]의 환입(도드리) 가락에서 나왔다.
이 곡은 조선 후기 풍류방에서 [영산회상] 한 바탕의 연주를 마친 후 이 곡으로 끝맺음을 하면서 ‘뒷풍류’라는 아명으로도 불리었다. 흥청거리는 ‘타령 장단’으로 계면가락도드리를 시작하여 한배가 빠른 ‘양청도드리 장단’으로 몰아가다가 다시 타령 장단인 우조가락도드리로 마무리 한다. 이로써 연주자와 감상자들이 흥겨운 마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다. ....
 ....
....